CJ CGV의 미래, ‘극장’ 아닌 ‘콘텐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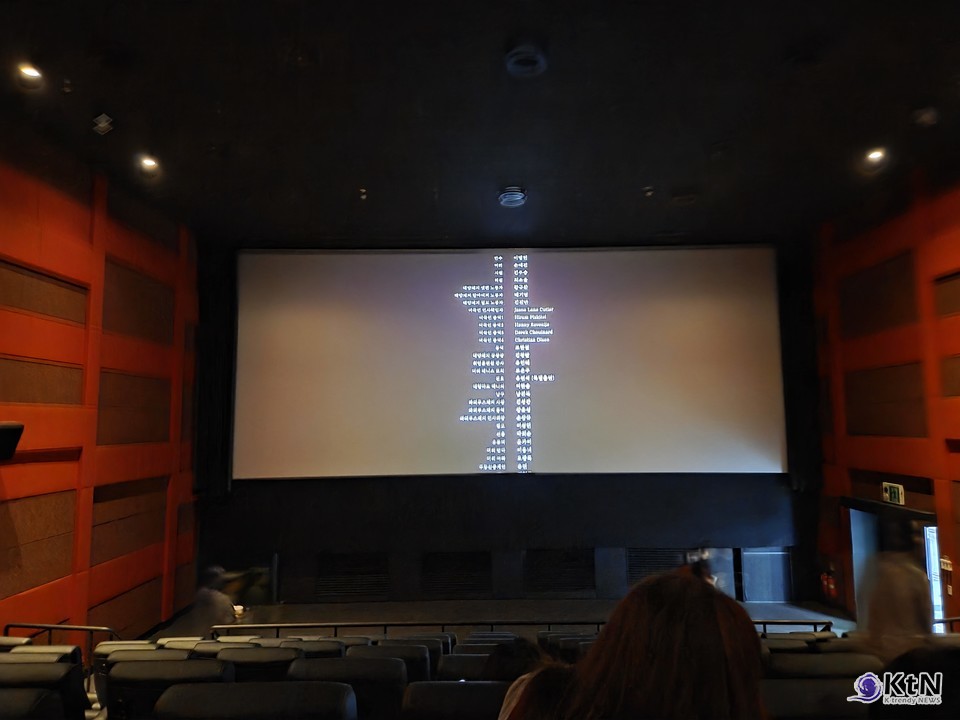
[KtN 박준식기자]CJ CGV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단순한 회계 보고서가 아니다. 이 실적은 극장산업이 더 이상 좌석을 채우는 산업이 아니라, 콘텐츠를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이 수익을 만들고, 경험이 매출을 대체하며, ‘스크린’이 ‘플랫폼’으로 바뀌는 현장이다.
CJ CGV는 2025년 3분기 매출 5,831억 원, 영업이익 234억 원을 기록했다. 수치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이 전사 실적을 견인했고, 4DX와 SCREENX 같은 기술 특별관이 수익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한때 ‘국내 관객 감소’가 최대 리스크로 꼽히던 기업이, 이제는 글로벌 기술 브랜드로 평가받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사업 다각화’가 아니다. 산업의 논리가 바뀌고 있다. CJ CGV는 이제 좌석 점유율을 계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관객의 시간과 감각을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동 중이다.
동남아, 콘텐츠 현지화가 만든 새로운 경제권
CJ CGV의 베트남 법인은 3분기 매출 671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42.2퍼센트, 359.4퍼센트 증가다. 단순히 관객 수가 늘어서가 아니다. 현지 영화 ‘무아도(Mua Do)’가 80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CJ CGV는 이 작품의 배급과 상영을 직접 맡았다. 즉, 극장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한 축으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이 모델은 단순한 상영 수익이 아니라 콘텐츠 지분 참여형 수익 구조로 전환된 사례다. 로컬 제작사와 공동 투자해 흥행 시 이익을 배분하고, 극장 자체의 상영권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한다. 이 방식은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을 하나로 묶는 구조다. 콘텐츠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연결고리를 통제할 수 있기에, 수익률이 높고 시장 리스크에도 강하다.
CJ CGV는 베트남을 ‘동남아 콘텐츠 허브’로 삼고 있다. 현지 영화인과 제작사를 육성하고, K콘텐츠와 합작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한국형 콘텐츠 시스템을 이식하면서도 현지 감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문화의 플랫폼화다. 극장은 상영공간이 아니라 문화 생산과 소비의 순환 지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문화현장NOW] 영화 한 편 ‘천 원’ 시대…문체부, 6000원 할인권 450만 장 푼다 사진=2025 07.23 용산 cgv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https://cdn.k-trendynews.com/news/photo/202511/194348_324665_433.jpg)
기술이 만든 수익의 새로운 질서
CJ 4DPLEX의 4DX와 SCREENX는 이제 극장산업의 새로운 화폐다. 3분기 4DPLEX 매출은 340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핵심 포맷 매출은 전년 대비 56퍼센트 증가했다. 4DX와 SCREENX의 티켓 가격은 일반관보다 평균 30퍼센트 높고, 좌석당 부가 매출이 1.5배 이상 많다.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모델’로 바뀐 셈이다.
이 구조는 산업적 의미가 크다. 극장은 더 이상 콘텐츠의 종착점이 아니다. 기술은 관객의 감각을 자산화했고, 그 자산이 곧 수익으로 환산된다. CJ CGV가 글로벌 극장 체인 AMC, Cinepolis, Cinemark 등과 협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이 곧 유통망이 되고, 기술 표준이 곧 시장 점유율로 연결된다.
CJ CGV의 SCREENX 포맷은 3면 스크린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상영 방식이다.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이 포맷을 전제로 영화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았다. 기술은 더 이상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일부다. 이 연결 구조가 CJ CGV를 단순한 극장사업자에서 기술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모시킨다.
국내 시장, 효율화가 아닌 재정의의 단계
국내 사업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5년 3분기 국내 매출은 1,962억 원, 영업손실 5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객 감소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CJ CGV는 손실 축소에 성공했다. 고정비 절감, 사이트 구조 개선, 인력 효율화로 영업손실 폭을 2분기 대비 대폭 줄였다.
이 변화의 본질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전환이다. 과거의 극장은 스크린 수와 좌석 점유율로 평가받았다. 이제는 ‘좌석당 경험 가치’가 수익의 척도다. CJ CGV는 국내 주요 극장에 기술 특별관 비중을 늘리며 수익 단위를 재정의하고 있다. ‘좀비딸’, ‘F1 더 무비’ 등 장르영화와 기술 포맷을 결합해 객단가를 높이고, 관람 체험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국내 시장의 체질 개선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산업 구조 혁신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운영 효율화를 넘어, 기술·콘텐츠 융합형 극장 모델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플랫폼
CJ CGV의 전략은 결국 콘텐츠와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시도다. 극장은 더 이상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콘텐츠와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다.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구조가 아니라, 콘텐츠의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첫째, 콘텐츠의 로컬화(Localization). 베트남 ‘무아도’ 사례처럼, 현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현지 시장을 이끈다.
둘째, 기술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4DX와 SCREENX 같은 포맷은 국가를 초월한 표준으로 기능한다.
셋째, 경험의 자산화(Monetization of Experience). 관객이 느끼는 감각적 경험이 곧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CJ CGV는 극장이 아니라 경험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된다. 상영관, 기술, 데이터, 콘텐츠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며, 수익은 경험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문화경제의 시선에서 본 CJ CGV의 전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CJ CGV의 전략은 ‘비용 산업’에서 ‘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이다. 극장은 오랫동안 고정비 중심의 산업이었다. 임차료, 인건비, 설비비가 수익 구조를 제한했다. 그러나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가 바뀌고 있다. 기술은 단가를 높이고, 콘텐츠는 체류 시간을 늘린다. 그 결과, 수익은 좌석당이 아니라 ‘경험당’으로 측정된다.
이는 문화경제의 새로운 형태다. 소비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간’을 산다. 극장은 그 시간을 설계하는 플랫폼이다. CJ CGV는 이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실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이다. 관객 데이터를 분석해 상영 스케줄, 좌석 배치, 가격 정책을 자동 조정한다. 기술이 관객의 시간을 관리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CGV의 미래, 콘텐츠 플랫폼
CJ CGV는 이제 극장을 넘는다. 동남아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글로벌에서 기술 포맷을 확산하며, 국내에서는 플랫폼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이 세 축이 하나로 연결되면, CJ CGV는 ‘극장 체인’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된다.
극장은 여전히 불확실한 산업이다. OTT와의 경쟁, 제작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은 많다. 그러나 CJ CGV가 보여주는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익의 근원이 좌석이 아니라 ‘콘텐츠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자산이 되고, 플랫폼이 시장이 되는 시대. CJ CGV의 행보는 한국 문화산업의 다음 단계를 예고한다.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한 플랫폼, 그 구조가 곧 문화경제의 새로운 언어다.
CJ CGV의 미래는 극장이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이다.

